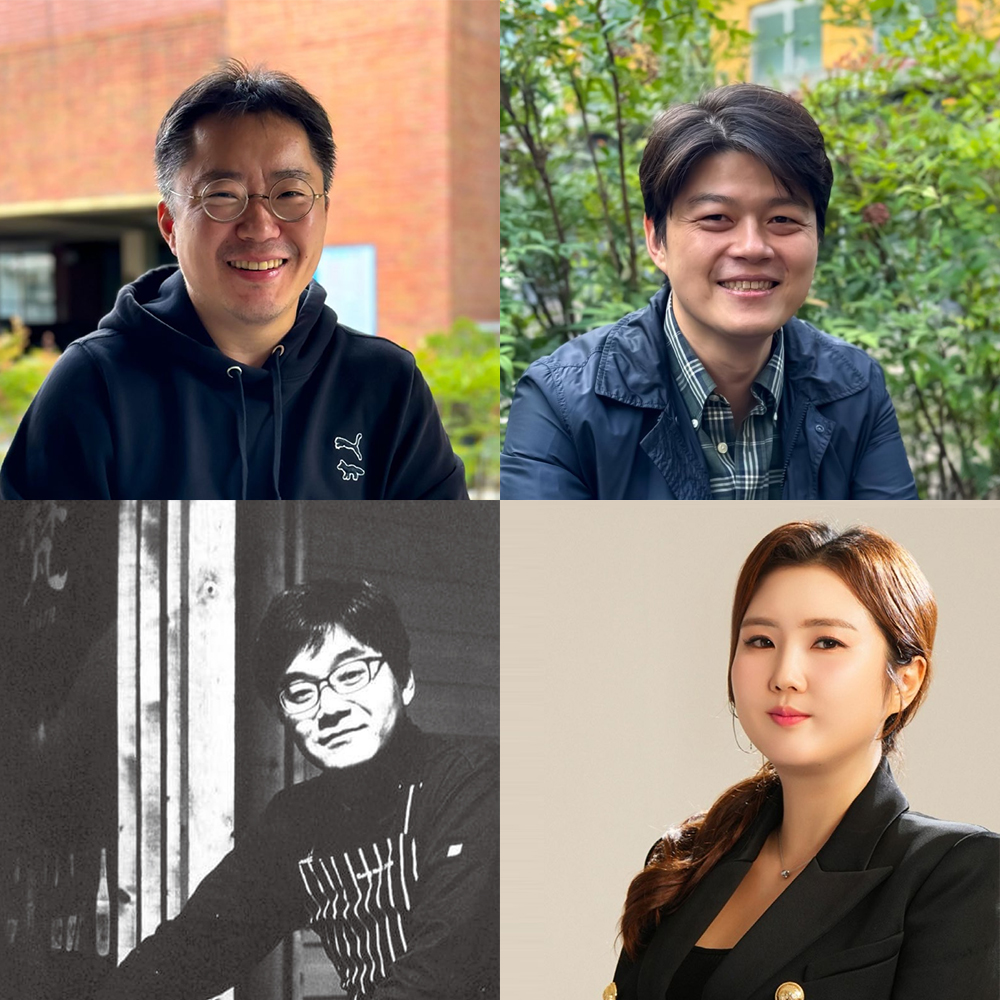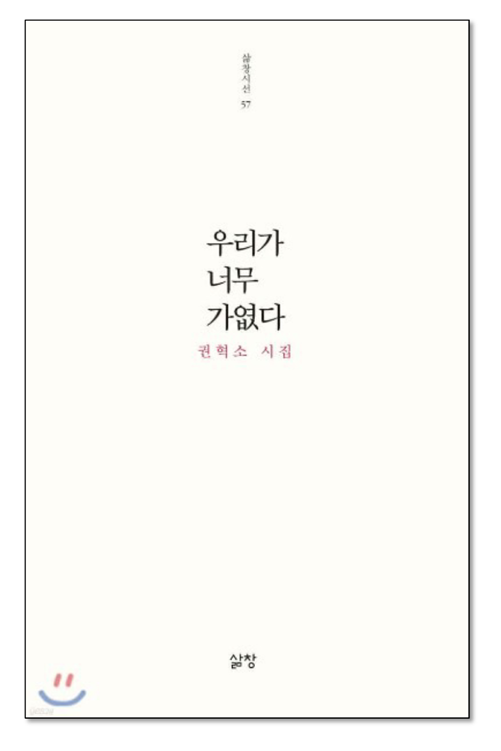
넉넉하고 따뜻한,
추억을 일깨우는 ‘칼국수’
국수를 먹어야지 생각하니
마음이 넉넉해지고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여기 칼국수 두 개요,
주문을 하고 나니 속이 따듯해지면서
엄마의 두리반 앞에 엎드린 내가 보인다
첫눈이라도 오실 것 같은 날
가난했던 엄마를 만나러,
간이 조금씩 세지는
할머니 칼국수 먹으러 간다
-권혁소 시 <할머니 칼국수>
(『우리가 너무 가엾다』, 2019, 삶창) 전문
생각과 마음
날씨처럼 마음이 을씨년스럽다. 호주머니는 가볍고 발걸음은 무겁다. 그런 날 배까지 헛헛하면 올깍 서러워
지기 십상이다.
‘국수를 먹어야지!’ 가만한 생각만으로 마음이 넉넉해지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토록 소박한 행복에 들뜬 시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여기 칼국수 두 개요!”
국수집은 회전율이 좋아서 아무리 소문난 맛집이라도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가격 또한 비교적 저렴해서 내 것에 동행의 몫까지 계산해도 부담이 없다. 대단한 대접은 아닐지라도 친구에게 한 끼쯤 베풀고픈 염치를 거뜬히 채운다. 특히 칼국수는 2인분이나 3인분을 주문하면 한 그릇에 담아 나눠먹도록 하는 식당이 많다. 커다란 그릇 하나로 나오면 각각의 그릇으로 받아먹는 것보다 양이 더 많고 푸짐하게 느껴진다. 혼자 먹기보다 함께 나누기에 맞춤한, 칼국수는 다정한 음식이기도 하다. 국수는 대개 ‘각 잡고’ 차려먹는 요리라기보다 오다가다 먹을 수 있는 요깃거리로 여겨진다. 당장의 시장기를 면하도록 빠르게 먹고 치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물우물 몇 번만 씹으면 후루룩 목구멍으로 미끄러져 넘어가버리니 성질 급한 사람에게도 제격이다. 옛적 궁중에서도 아침저녁에는 임금께 ‘수라’를 올리고, 정사를 보느라 바쁜 한 낮에는 국수와 다과로 간단한 ‘낮것’을 차렸다는 기록이 있다. 경쾌한 목소리로 주문을 하고 나니 잊었던 허기가 일깨워지며 없던 입맛도 돋아난다. 심상한 일상을 묘사하던 시인의 붓이 본격적으로 시(詩)의 세계를 그리기 시작하는 것은 그때부터다. 칼국수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짧고도 아득한 기억의 시간.

엄마의 두리반
다락에서 두리반이 끌려 나와 방 한가운데 펼쳐진다. 마른 행주로 잘 닦은 두리반 위에 뽀얀 밀가루가 조심조심 덮인다. 미리 반죽해 면 보자기를 씌워 둔 덩어리를 얹고 반들반들 길이 든 홍두깨로 힘주어 민다. 밀수록 반죽은 납작해지고 종내 마법처럼 얄팍해진다. 적당한 두께로 밀린 반죽을 착착 접어 썰기에는 대장간에서 두들겨 만든 무쇠 칼이 제격이다. 이때쯤 솥 안에서 육수가 펄펄 끓으며 김이 올라온다. 꼬르륵 배 속에서 보채는 소리가 절로 샌다.
『천년 한식 견문록』(정혜경, 2013)에 의하면 칼국수의 시조로 추정되는 절면(切麵)은 목판에 반죽을 놓고 얇게밀어서 써는 것은 지금 칼국수를 만드는 방식과 같지만, 조선시대에는 국수를 삶아낸 후 반드시 찬물에 담가 전분의 끈끈함을 제거하고 면발을 쫄깃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가난했던 엄마’는 저렴한 비용으로 든든하고 맛있게 식구들을 배 불릴 방도를 궁리했고, 그러다 보니 때와 장소에 따라 쉽게 구할 수 있는 멸치, 바지락, 닭, 들깨, 팥 등등을 활용한 칼국수가 만들어졌다. 강릉이 고향인 내가 어릴적 ‘엄마의 두리반 앞에 엎드’려 기다리던 칼국수는 감자와 호박을 듬뿍 넣고 강릉식 막장을 풀어 끓인 장칼국수였다. ‘첫눈이라도 오실 것 같은 날’ 혹은 추적추적 비 내리는 날, 세상의 냉기에 움츠러든 어깨를 펴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한 그릇 뚝딱 비우고나면 조금은 더 살아낼 용기와 힘이나는, 그때의 칼국수는 선연한 추억의맛이다. 지나갔지만, 지울 수 없는.

잔칫날이나 제사 때 넓은 상에서 요술같은 요리가 펼쳐지곤 했던 우리네 두리반상
삶의 맛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나이가 들면 혀가 늙고 입맛도 늙는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다. 노화 현상의 하나로 맛을 느끼는 미각세포가 있는 미뢰(味蕾)의 크기와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게다가 혀 뒤쪽에 있는 신맛과 쓴맛을 느끼는 미뢰는 더 잘 기능하고 앞쪽에서 단맛과 짠맛을 느끼는 미뢰의 기능은 떨어진단다. 45세부터 시작되어 60대에 최고조에 달한다는 미뢰의 변화는 인생 그 자체에 대한 은유만 같다. 달콤하고 짭짤한, ‘단짠단짠’의 젊음이 저물어간다. 시금털털하고 쓰디쓴 삶의 맛을 곱씹으며 남아있는 날들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때로 그 맛에 속을지라도 먹고, 살아내야만 하는 삶의 지상 명령은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더 이상 세상에 없는 ‘가난했던 엄마’를 대신한 손맛일진대, 시인은 ‘할머니 칼국수’의 간이 점점 세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단골집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게다. 하필이면 땀과 눈물은 짠맛이다.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반드시 흘려야만 하는 삶의 물기는 그토록 짭조름하기 마련이다. 다만 열심히 살아냈을 뿐인 이에게 맛이 변했다, 간이 세다고 타박하기보다는 칼국수 사발에 슬쩍 물을섞어 휘휘 저어버리면 어떨까?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쫄깃한 면을 후루룩 빨아들이고 국물을 시원하게 들이켜는 것이다. 넉넉하고 따듯한, 그 사랑의 기억만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칼국수의 맛일진대.

소설가 김별아
2018년 제10회 허균문학작가상 <구월의 살인>
2016년 제10회 의암주논개상
2005년 제1회 세계문학상 <미실>
김별아는 강원 강릉에서 나고 자랐으며, 1993년 등단한 뒤 제1회세계문학상 수상작 <미실> 등 15편의 장편 소설을 포함해 소설집, 에세이, 동화 등 30여 권의 책을 펴냈다. 2022년부터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