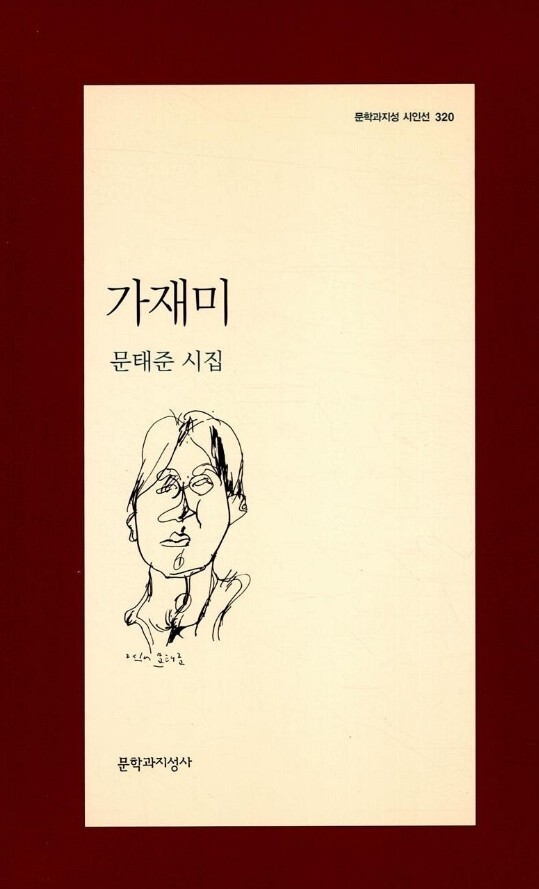씹을수록 감칠맛나는 속담 속 국수이야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짧은 문장의 비유적인 말을 속담이라고 한다.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삶의 지혜와 교훈, 경계해야 할 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다.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특별한 문화적, 사회적 관념과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속담은 우리 조상들이 생활하면서 만들어 낸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진술하여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속담은 세상살이의 통념과 지혜를 전하는 동시에 날카로운 해학과 풍자(諷刺)의 의미를 담을 때가 많다. 어떤 일을 경계하는 교화의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단면을 재치 있게 드러내면서도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 관계나 사회적 모순을 비판하기도 한다. 서민의 문화를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면서도 삶의 보편적 진리나 가치를 담아내는 속담은 삶의 보편적 진리를 드러낸다.
속담은 일상의 현상을 비유하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를 반영한다. 사물과 낱말들을 통해 삶을 관통하는 재치와 풍자 등을 담아낸다. 그리고 구전되는 과정에서 생명력을 얻어 널리 쓰이는 특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음식과 관련된 속담은 삶과 밀접하면서도 씹는 맛이 있고 감칠 맛이 난다. ‘국수’가 담긴 속담을 찾아보니 그 맛이 일품이다. 하나 하나 들여다보며 그 의미를 곱씹어 보자.
국수 잘하는 솜씨가 수제비 못하랴
어려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쉬운 일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 국수는 반죽을 밀고 치대고 써는 과정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잔칫날에나 맛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수제비는 쉬운 것인가? 거꾸로 말하면 국수보다 한 수 아래 정도로 풀이해 볼 수 있겠다. 기술의 차이 라기 보다는 반죽과 동시에 끓는 물에 손으로 뚝뚝 떠내니 시간이 훨씬 덜 들고 노동의 강도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국수를 잘하는 사람은 수제비도 잘한다는 것이다. 하나를 잘 하면 다른 일도 잘한다.
국수 먹은 배
국수를 먹으면 그때는 배가 잔뜩 부르지만 얼마 안 가서 쉽게 꺼지고 만다는 뜻으로, 먹은 음식이 쉽게 꺼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실속 없고 헤픈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른다. 어떤 일을 하고 효과가 없을 때에도 쓰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국수는 문 지방 넘기 전에 소화된다는 옛 어른들의 심심치 않은 불평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음식에는 고명이나 웃기, 꾸미 등 국수 위에 얹는 고기와 채소류 등이 있었다. 국수를 그냥 먹지 않고 다른 영양소를 보충하는 과학이 아닐까? 우리가 국수를 먹을 때 전이나 수육을 곁들여 먹는 이유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더운 국에 국수사리 풀어지듯
어떤 일이 쉽게 되어 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우리 선조들은 국수를 국에 말아먹었고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굳어진 국수 면발에 뜨거운 국이 부어지며 흐물흐물 늘어지며 가닥가닥 퍼지는 상태가 되는 이미지가 연상된다. 국수사리에서 사리는 “또아리를 틀다”에서 유래된 순우리말로 국수, 실 따위를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뭉치나 그 수량을 세는 단위를 말한다. 잔칫날 국수뭉치를 그릇 하나 하나에 담아 놓고 손님이 들이닥치면 그 때 뜨거운 물을 부어 내는 시끌벅적 흥겨운 소음이 후루룩 맛있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듯하다.
메밀 밭에 가서 국수를 달라겠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는 뜻의 북한 속담이다. 메밀은 우리나라에 밀이 흔치 않았던 옛날에 선조들의 지혜로 만들었던 음식이다. 날씨가 추운 지역에서는 구하기 힘든 밀 대신 메밀로 만든 국수를 만들어 먹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뜻은 오래 기다려야 먹을 수 있음에도 당장 내놓으라는 것이다. 밥을 다하고 모두가 밥을 뜬 후에 남은 누룽지에 물을 부어야 드디어 먹을 수 있는데 그 숭늉을 우물가에서 찾으니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그러겠는가? 그렇다면 메밀 밭에서 찾는 국수는 어떠 한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먼저 메밀을 수확한 후 털고 껍질을 제거해야 한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반죽을 한 후 압출기에 넣고 있는 힘껏 눌러서 뽑아야 면이 나온다. 그 과정이 얼마나 길겠는가?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 일침을 놓을 때 쓰기 딱 알맞은 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상투가 국수 버섯 솟듯
상투가 더부룩하게 솟아오르는 국수버섯처럼 우뚝하다는 뜻으로, 의기양양하여 지나치게 우쭐거리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왜 국수버섯일까? 국수가 버섯 모양으로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수버섯이 존재한다. 국수를 썰어 놓은 모양 같다고 해서 국수버섯이라 불리는데 삐쭉하게 솟아올라 온다. 19세기까지 국수라는 음식은 일반인이 쉽게 먹을 수 없었고 잔칫날에나 맛볼 수 있었으니 국수버섯 솟아오른 모양도 매우 도도해 보였을 것이다.

삐죽삐죽 솟아 있는 국수버섯. 국수를 썰어 놓은 모양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인디카
중 먹을 국수는 고기를 속에 넣고 담는다
남의 사정을 잘 봐주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여기서 “중”의 사정이란 무엇일까? “중”은 불가에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따라 수련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머리를 깎고 절에 살면서 신도들의 시주를 받고 사는데 시주를 받으러 속세에 내려오기도 한다. 높은 스님은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을 테니 “중”이란 낮은 스님이나 어린 스님일 것이다. 한참 배고프고 혈기왕성 할 때이니 고기 한 점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 음식에 담긴 뜻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닿는지 알 수 있는 속담이다. 익살스럽지만 밉지 않은 이 속담에서 선조들의 해학이 느껴진다.

김홍도의 민속화 탁발승
시어미가 오래 살다가 며느리 환갑날 국수 양푼에 빠져 죽는다
사람이 너무 오래 살게 되면 못할 일을 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사람이 너무 오래 살면 말년에는 별의별 망측스러운 꼴을 다 당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 속담에서는 2가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첫째, 환갑날 같은 경사에 먹었던 음식인 국수 그릇이라 하니 경사스러운 날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는 뜻이고 둘째, 며느리의 환갑은 본인의 팔순 즈음이니 그 옛날 얼마나 장수했다는 것인가? 왜 하필 시어머니고 왜 하필 며느리일까? 다소 거친 표현일 수 있으나 해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수 못하는 여자가 피나무 안반만 나무란다
“굿 못하는 무당 장구만 타박한다” “쟁기질 못하는 놈이 소를 탓한다”와 같은 맥락의 말이다. 자기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애매한 도구나 조건만 가지고 나쁘다고 탓함을 비꼴 때 쓴다. 안반은 커다란 도마에 해당하며 요즘은 중국집에서 반죽 쳐대 면발 늘일 때 쓰지만 예전의 안반은 도마나 떡판으로 많이 쓰였다. 안반은 느티나무로 만든 것을 최상으로 쳤지만 피나무 역시 나이테가 조밀하고 갈라지거나 터지는 일이 적어 안반 재목으로 널리 쓰였다. 꽤나 괜찮은 안반인데도 안반이 별로라서 일이 더디다고 탓한다는 말인 것이다. 피나무로는 불상이나 불경을 얹어두는 상과 밥상, 교자상, 두레상을 만들기도 했다. 국내의 전통 목각 재료는 주로 피나무 목재가 많이 사용된다. 재질이 부드러우면서도 뒤틀림이 없어 조각하기에 더없이 좋은 재료이기 때문이다.

떡을 치거나 국수를 밀 때 사용하던 안반 ⓒ한국학중앙연구원
서민들의 말, 속담은 해학과 풍자 속에 삶을 통찰하는 지혜와 재치가 담겨 있다.
국수 한 그릇과 속담 한 줄은 우리들 삶에 얹어지는 특별한 맛이다.
4차 혁명의 시대 AI 시대가 되어도 우리 한민족의 능력은 계속 진화되고 발전될 것이다.
국수 잘하는 솜씨가 수제비 못하겠는가? 더운 국에 국수사리 풀리듯
21세기 대한민국도 여전히 술술 풀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국수 한 그릇 하러 갑시다. 여러분.

글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2004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2005년 재정경제부 차관보,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2007~2008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거쳐 2011~2013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3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 헌신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다. 지은 책으로 《한 끼 식사의 행복》이 있으며, <인사이트코리아>에 ‘김석동이 쓰는 한민족 경제 DNA’를 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