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바는 일본인들의 소울푸드다. 에도시대 때부터 대중적으로 먹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소바는 일본인들의 식생활 속에 녹아 있다. 일본 문화 콘텐츠 속에서 등장하는 소바는 결코 화려하지 않다. 평범하지만 없어서는 안되는 일상이자 그리운 추억이다. 소설, 영화, 만화 등 다양한 일본 문화 콘텐츠 속에서 소바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생명력을 갖는지 살펴봤다.
나쓰메 소세키
도련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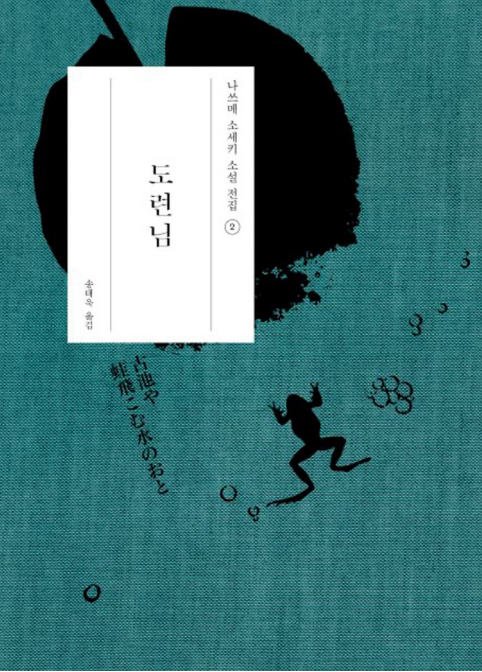
일본의 문호 나쓰메 소세키는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다.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그의 대표작인 이 두 작품에는 입맛을 다시게 하는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소개된다. 위궤양으로 평생 고생을 했음에도 그는 식탐이 많았고 대식가였다. 그의 부인이 쓴 <나쓰메 소세키, 추억>이라는 책에는 그가 단 음식을 좋아했다는 기록도 있다.
두 책에서 그는 소바에 대한 자신의 취향과 철학을 늘어놓는다. 먼저 <도련님>의 한 대목이다. “나는 메밀국수라면 사족을 못 쓴다. 도쿄에 있을 때도 메밀 국숫집 앞을 지나가다 그 냄새를 맡으면 꼭 들어가고 싶었다. 이곳에 와서 오늘까지 학교 수업과 그 놈의 골동품 잡동사니 때문에 메밀국수를 잊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메밀국수 간판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도쿄에 살다 불가피하게 시골 중학교 교사로 오게 된 주인공. 현지의 따분함을 견뎌내면서 도쿄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것은 좋아하는 메밀 국수였다. 식욕을 참지 못한 그는 가게에 들어가 ‘덴푸라 메밀 국수’를 시키는데 무려 네 그릇을 비우고 만다. 이 같은 모습이 학교에 소문이 나면서 그는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놀림감이 된다.
나쓰메 소세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선 소바를 먹는 방법에 대한 저자의 명확한 취향이 나온다. 고양이의 시점에서 서술되는 이 작품은 나쓰메 소세키의 자전적 소설이다. 주인공은 직업이 선생인 ‘주인’(고양이 입장에서 주인이다). ‘주인’을 찾아온 미학자 친구 메이테이는 소바 두그릇을 주문해 가져온다. ‘주인’이 메이테이에게 “이렇게 더운 날 소바는 독이나 다름 없다”고 하자 메이테이는 “좋아하는 건 좀처럼 탈이 나지 않는다”고 받는다. 소바를 좋아하는 메이테이는 걱정스러울 정도로 와사비도 듬뿍 넣는다. 메이테이는 젓가락으로 신나게 소바를 집어 올리지만 ‘주인’은 영 떨떠름한 표정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소바보다 우동이 좋다고 말한다. 곧바로 이어지는 메이테이의 반격. “우동은 마부들이나 먹는 거지. 소바의 맛을 모르는 사람만큼 딱한 이도 없네.” 그는 나름의 소바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파한다.
“이 긴 가락을 국물에 3분의 1쯤 담가서 한입에 후루룩 삼키는 거지요. 씹으면 안됩니다. 씹으면 소바의 맛이 사라지거든요. 주르륵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그 맛이 별미입니다.”
“제수씨. 소바는 대체로 세 입 반이나 네 입에 먹습니다. 그보다 손이 많이 가면 맛있게 먹을 수 없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비밀

일본 추리소설의 대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이 소설은 불의의 사고로 아내 나오코가 죽고 딸 모나미의 몸에 아내의 영혼이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판타지적 이야기다. 딸의 몸에 깃들인 아내의 영혼, 또 아내의 영혼이 잠들었을 땐 딸 모나미의 영혼이 살아나는 현실은 오직 남편인 스기타 헤이스케만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오코의 고향은 나가노이고 그곳에서 나오코의 아버지는 소바 집을 운영하는 소바 장인이다. 아버지가 보고 싶지만 나오코는 아버지 만나기를 꺼려한다. 아버지 입장에서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손녀딸이지만, 그 영혼은 딸이다. 나오코 입장에선 이 사실을 아버지가 눈치채기라도 하면 벌어질 사태가 걱정돼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다. 그래도 천륜은 끊을 수 없는 법. 모나미의 몸으로 아버지를 만난 나오코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며 모나미인 것처럼 행동한다. 하지만 메밀 반죽의 명인인 아버지가 직접 반죽해 쫄깃쫄깃한 찰기가 각별한 소바를 입안으로 넘기던 나오코는 그만 눈물을 참지 못한다. 깜짝 놀라는 아버지에게 나오코는 “엄마가 생각나서, 엄마가 할아버지 메밀국수 엄청 좋아했거든요, 엄마가 먹으면 좋을 텐데”라며 상황을 모면한다. 감각은 이성과 의지로도 억누를 수 없다. 미각, 특히 어릴 때부터 먹으며 각인된 음식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추억이 된다. 나오코는 말한다.
“그건 진짜 아버지가 반죽해 준 메밀이었어. 어려서 부터 먹어 온 아버지의 맛이야. 그게 입에 닿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 지더라고. 이러면 안되는데, 안되는데, 했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
구리 료헤이
우동 한그릇
국내에 동화책으로 소개된 이 책의 내용은 잘 알려져 있다. 섣달 그믐날 북해정이라는 우동집에 가난한 부인이 두 아들과 함께 찾아와서 우동 1인분만을 시킨다. 매년 같은 날 찾아와 1인분만을 시켜 나눠먹는 세모자가 안타까웠던 주인은 배려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넉넉하게 우동을 넣어준다. 언젠가부터 찾아오지 않던 이들 세모자는 십 수년이 지난 어느 해 섣달 그믐날 찾아와 우동 3그릇을 시키며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어려웠던 시절에 받았던 따뜻한 마음에 대한 감사였다.
읽다 보면 콧날을 시큰하게 하는 이 단편 소설의 원래 제목은 ‘한 그릇의 가케소바’다. 가케소바는 뜨거운 국물에 소바를 말아먹는 요리다. 국내에는 왜 우동으로 번역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오래전 번역된 책이다 보니 가케소바 보다는 국내 독자들에게 친숙한 우동으로 바꾸지 않았을까 추측해본다.
책에는 한해의 마지막 날은 소바 집이 일년 중 가장 바쁜 날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왜 그럴까. 일본에선 전통적으로 섣달 그믐날, 즉 한해의 마지막 날에는 소바를 먹는다. 이것이 ‘토시코시소바’(年越しそば)다. 즉 해를 넘기는 소바라는 뜻이다. 소바는 메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밀가루 면과 달리 툭툭 잘 끊어진다. 때문에 소바 면처럼 그 해의 나쁜 일들을 모두 끊어내고 또 긴 소바처럼 오래 살게 해달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 일본에선 이사를 가도 이웃들에게 소바를 돌린다. 앞으로 오랫동안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힛코시소바’라고 부른다.
만화
맛의 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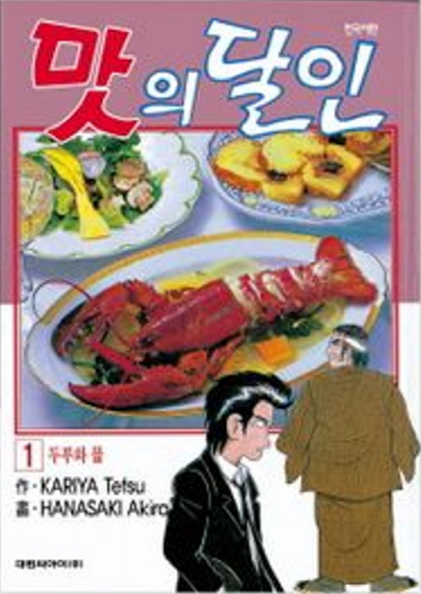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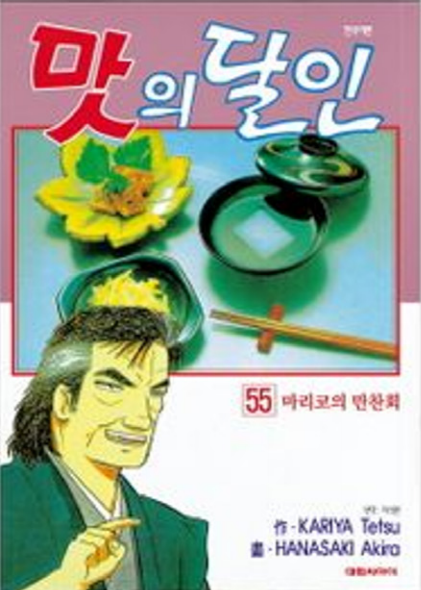
30년 이상 연재된 카리야 테츠의 만화 <맛의 달인>은 수많은 음식, 이를 즐기고 만드는 사람들의 철학과 취향, 다양한 사회상까지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음식 하나 만드는데 이 정도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인 장인들의 외골수 같은 면모를 보노라면 감탄이 나온다. 소바에 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다. 100% 메밀가루를 손으로 반죽해 소바를 내놓는 한 등장인물은 자신의 소바에 자긍심이 대단하다. 수돗물이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삶은 소바를 헹굴 때 우물물을 사용할 정도로 면에 집착한다.
하지만 정작 소바를 찍어먹는 국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는 유명 소바집에서 노하우를 배우며 맛있는 국물 만들기에 힘쓴다. 장인이 알려주는 이 과정이 만만찮다. 우선 땅속에 묻은 항아리에 간장을 넣고 따뜻한 물과 설탕을 녹여 섞은 뒤 3주간 그대로 묵혀둔다. 두껍게 깎은 가츠오부시를 끓는 물에 넣어 다시를 내고 국물을 걸러낸다. 이 다시 국물에 3주간 묵혀둔 간장을 넣고 요리술을 섞어 가열한 뒤 흙으로 만든 그릇에 넣어 24시간 둔다. 따뜻한 물에 이 토기를 넣어 45분간 두고 등나무 바구니로 뚜껑을 덮어 24시간 식히면 완성이다.
이대로 따라했을 때 기막힌 국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막상 엄두를 내기 힘들만큼 지난한 과정이다.
드라마
심야식당

심야식당에서 마스터가 만들어준 소스 야키소바/ 유튜브 화면 캡처
도쿄 도심 뒷골목. 매일 밤 12시면 문을 여는 식당이 있다. 이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평범한 샐러리맨부터 백수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연을 가졌다. 한밤중에 찾아와 허기를 달래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보니 아무래도 ‘평범’치 않은 사람들도 많다. ‘마스터’로 불리는 주인장은 사람냄새 풍기는 이 공간을 꾸려간다.
어느 날 심야식당을 찾은 카자미 린코도 그렇다. 한물 간 아이돌 출신 배우인 그는 이곳을 찾아 ‘소스 야키소바’를 주문한다. 마스터는 각종 채소와 소바를 프라이팬에 볶아 계란 프라이를 얹어 내준다. 이후로도 식당을 찾을 때 마다 카자미 린코가 주문하는 메뉴는 동일하다. 알고 보니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많이 만들어준 음식이었다. 그는 소스 야키소바를 통해 그 시절을 추억하며 팍팍한 현실에서 위로를 찾고자 한다. 드라마에선 소스 야키소바에 시만토강의 파래를 뿌리면 훨씬 더 맛있다는 대목도 나온다. 어떤 사연인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딸 카자미 린코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버지가 우연 찮게 심야식당을 방문해 마스터에게 그 비법을 알려준다.
고치현에 있는 시만토강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답고 맑은 강으로 꼽힌다. 이곳은 파래 뿐 아니라 은어 등 풍성한 해산물로도 유명하다.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이 작품은 자매들의 이야기다. 세 자매는 오래전 가족을 떠난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복 여동생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네 자매의 이야기다.
상처를 나누고 보듬고 회복하며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요소는 바로 음식들이다. 기억을 공유하는 것도, 다시 위로를 받고 힘을 내게 만들어 주는 것도 음식이다.
함께 먹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은 딱히 두드러지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평범한 음식들과 함께 한다. 낯선 이복동생 스즈가 세 언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온 첫날 이들이 함께 먹는 음식은 소바다.
“금방 삶아야 맛있다”면서 이들은 소바를 삶아 툇마루에 둘러 앉는다. 소바와 함께 곁들이는 또 다른 음식은 가지와 연근 튀김이다.

박경은
경향신문 문화부 부장
1995년 경향신문에 입사한 뒤 산업부, 문화부에서 주로 일했다. 음식이 별도의 취재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음식 담당’ 기자가 되길 꿈만 꾸며 30년 가까이 보냈다. 그래도 내가 뭘 취재하든 음식과 엮으려는 노력을 해온 덕에 종교와 음식을 엮은 <성스러운 한끼>를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