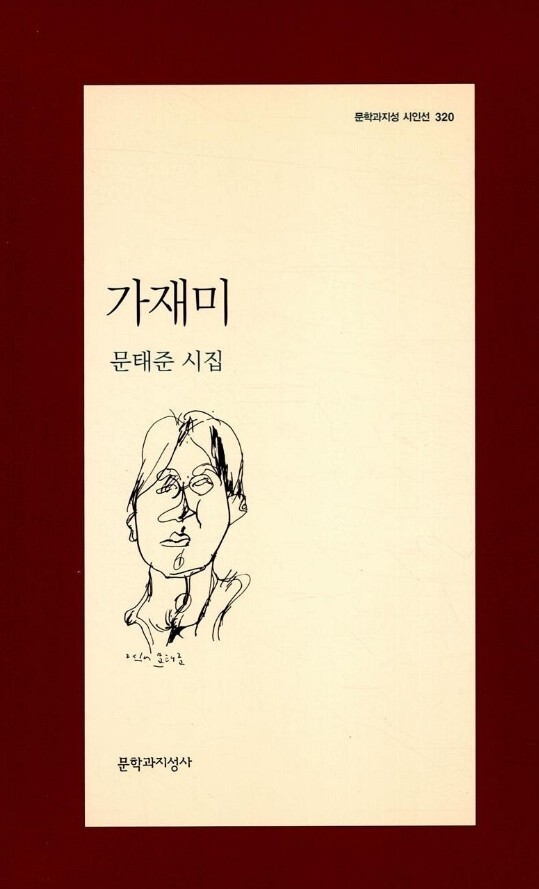먹어야만 맛인가? 읽는 것도 맛이 있다!
국수를 소재로 쓴 시나 소설로 식탁 위의 문학 기행을 떠나 보자. 소박한 음식이나 국수 한 그릇엔 정, 그리움, 추억 등이 차고 넘친다. 허기지고 입맛 없을 때 후루룩 먹을 수 있는 국수는 소시민을 대변하는 음식이다. 일상적인 삶과 소박한 정서를 환기시키는 소재로 이만한 음식이 있을까 싶다.
평상이 있는 국숫집
평상이 있는 국숫집에 갔다
붐비는 국숫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쯧쯧쯧쯧 쯧쯧쯧쯧,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쯧쯧쯧쯧 쯧쯧쯧쯧,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문태준 시인의 시집 <가재미>
문태준 시인의 시집 <가재미>(문학과 지성사)에 실린 시 ‘평상이 있는 국숫집’이다. 시인은 “붐비는 국숫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라고 말한다. 흔히 사람이 모이는 공간, 소통하는 공간으로 대변되는 슈퍼와 국숫집이 닮은꼴이다. 아프고 고단했던 이들이 평상에 앉아 “친정 오빠”를 만난 것처럼 서로의 삶을 위로해 주는 정겨운 분위기는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로 다정다감하게 담겨 있다. 재밌는 건 “쯧쯧쯧쯧 쯧쯧쯧쯧”하는 의성어다. 국수를 씻는 소리 같기도, 혀를 차는 소리 같기도 한데 국숫집 풍경 속으로 사람들이 나누는 위로와 교감이 절묘하게 버무려져 있다.
국숫집에서의 명상
빗줄기 나를 끌고 들어선 곳
처마 밑으로 모여드는 둥근 빗소리
어디에서 오래도록 숨어 살았더냐
온몸 던져버릴 수 있는 그들 앞에
다만 한 그릇 국수와 마주 앉아 있다
길이라곤 보이지 않는저 허공 속
사람의 육안으로 잡히지 않는 길
살아갈 길만큼 길어 보이는 국수 가락
추적추적 말아 올리노라면 울컥, 묵은
생각의 잔뿌리 끊어 버리고만 싶다
정이랑 시집 <버스정류소 앉아 기다리고 있는,>(문학의전당)에 실린 ‘국숫집에서의 명상’이다. ‘추적추적’의 사전적 의미는 자꾸 물기가 축축하게 젖어 드는 모양이다. 대체로 비나 눈물과 어울려 잘 쓰이는 단어나 이 시에선 국수 가락에 붙었다. “추적추적 말아 올리노라면 울컥”하고 목메게 하는 건 국수인데 “길이라곤 보이지 않는 저 허공 속” “살아갈 길만큼 길어 보이는” 정류장 속 사람들의 아득한 길이 국수 그릇에 담겨버렸다. 분주히 정류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무거운 발걸음에 연민을 담은 시인의 시선이 느껴진다.
국수가 먹고 싶다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 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서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 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칫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음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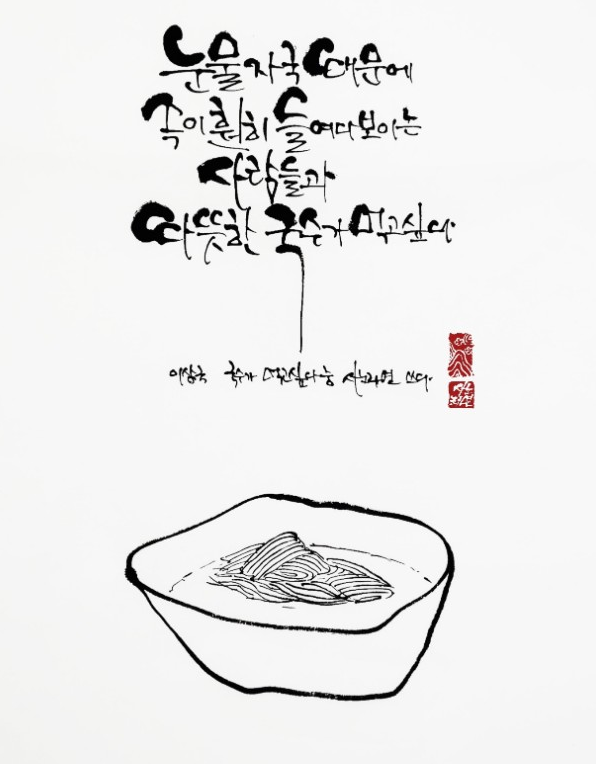
붓끝에 시를 묻혀 캘리 한 조각 ⓒ사노라면
이상국 시인의 시집 <국수>(강)에 실린 ‘국수가 먹고 싶다’도 국수 한 그릇으로 위무를 건네고 싶은 시인의 마음이 녹아 있다.
시인이 허름한 식당의 어머니 같은 여자,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를 먹고 싶은 이유는 “세상은 큰 잔칫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다. 삶이 힘겨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한 국수 한 그릇으로 데워주고 싶은 바람일 거다. 시인의 또 다른 시 ‘국수 공양’ 속 국수는 삶의 경건함도 느껴진다.
국수 공양
동서울터미널 늦은 포장마차에 들어가
이천 원을 시주하고 한 그릇의 국수 공양(供養)을 받았다
가다꾸리가 풀어진 국숫발이 지렁이처럼 굵었다
그러나 나는 그 힘으로 심야버스에 몸을 앉히고
천릿길 영(嶺)을 넘어 동해까지 갈 것이다
오늘밤에도 거리의 도반(道伴)들이
더운 김 속에 얼굴을 묻고 있다”
늦은 밤 심야버스를 타고 먼 길 가는 시인에게 국수는 지친 몸을 일으키는 음식이다. 섬기는 마음이 담긴 ‘공양’이란 단어를 쓰며 국수 파는 사람을 높인 건 생의 기운을 불어넣어 준 감사함일 터다.
국수
아,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희수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 쩡하니 닉은 동티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추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담배 내음새 탄수 내음새
또 수육을 삶는 육수국 내음새
자욱한 더북한 삿방 쩔쩔 끓는
아르궅(아랫목)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시인 백석의 ‘국수’ 시 일부다. 국수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로 1941년 <문장>지에 발표된 작품이다. 안도현 시인이 쓴 <백석평전>(다산책방)에 따르면 백석이 오산학교에 다닐 무렵 학교 주변엔 작은 마을이 있었다. 학생들은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출출함을 달래려 중국음식점이나 국숫집을 즐겨 찾았다고 한다. 추운 겨울 국수를 먹던 평안도 고향 마을 추억이 녹아 있다.


일본 유학시절의 백석 시인(왼쪽), 영어교사 시절의 백석 시인 (오른쪽) ⓒ시사인
평안도에서는 냉면을 국수라고 불렀다. ‘쩡하니 닉은 동티미국’ ‘얼얼한 댕추가루’ 같은 묘사가 냉면을 자동으로 떠오르게 한다.
눈이 많이 나와서
산엣새가 벌로 나려 멕이고
눈덩이에 토끼가 더러 빠지기도 하면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로 시작되는 이 시는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으젓한 사람들과 살틀하니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로 끝맺으며 국수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달뜨고 술렁이는 따뜻한 분위기를 전한다. 김숨 작가가 쓴 소설 <국수>(창비)는 국수에 대한 묘사가 매우 농밀하다. 밀가루가 반죽과 숙성의 시간을 거쳐 국수가 되는 일련의 조리 과정을 통해 주인공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새어머니와 오랜 시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됐음을 시사한다.
주인공 ‘나’에게 새어머니는 국수에 따라붙는 자동 생성어다. 애를 낳지 못해 이혼당하고 식모처럼 사남매집에 오게 된 새어머니는 집에 온 첫날 국수를 해줬다. 결혼 8년 만에 어렵게 임신한 주인공이 아이를 유산하자 새어머니가 새벽같이 고속버스를 타고 달려와 해준 음식도 닭칼국수다. 가출한 친어머니 자리를 대신한 새어머니를 부정하고 밀어내던 열 네 살의 나는 마흔 살이 넘도록 새어머니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새어머니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긴 건 새벽에 걸려 온 전화를 받은 뒤다. “혀 좀 끊어줘라” 암이 퍼진 혀의 절제를 앞둔 새어머니에게 나는 밀가루 반죽을 빚어 국수를 끓여준다. 자신처럼 아이를 낳지 못한 새어머니. 그가 반죽을 빚어내 뽑아낸 끈 같은 국숫발은 자식이란 끈을 대신한 게 아닌가싶어 울컥한다. 반죽을 퍽퍽 치대는 시간이 가슴 속 응어리를 푸는 시간이었겠다 짐작해 본다. “얼마나 더 주무르고 치대고 이겨야 국숫발을 뽑기에 적당한 반죽이 될까요. 당신의 양푼 속에 소금물을 부어가며 치대고 치댄 것, 그것은 어쩌면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소설 속 국수는 맛 이상의 ‘무엇’이다. 새어머니의 외롭고 고단했을 삶을 반추하며 건넨 ‘미안함’처럼 맛 너머의 맛을 가진 음식이 국수다. 소박하면서도 친근한 서민들의 음식이었던 국수엔 그렇게 우리네 삶이 담겼다.

글 김미영
한겨레신문 영상소셜팀 기자
<한겨레21> <한겨레신문>에서 경제부, 문화부, 사회부 등을 거친 21년 차 기자다. 면발 뽑듯 많은 기사를 쓰며 ‘선주후면(先酒後麵, 먼저 술 마시고 국수를 먹는다)’을 생활화하다 <대한민국 누들로드>라는 책도 썼다.